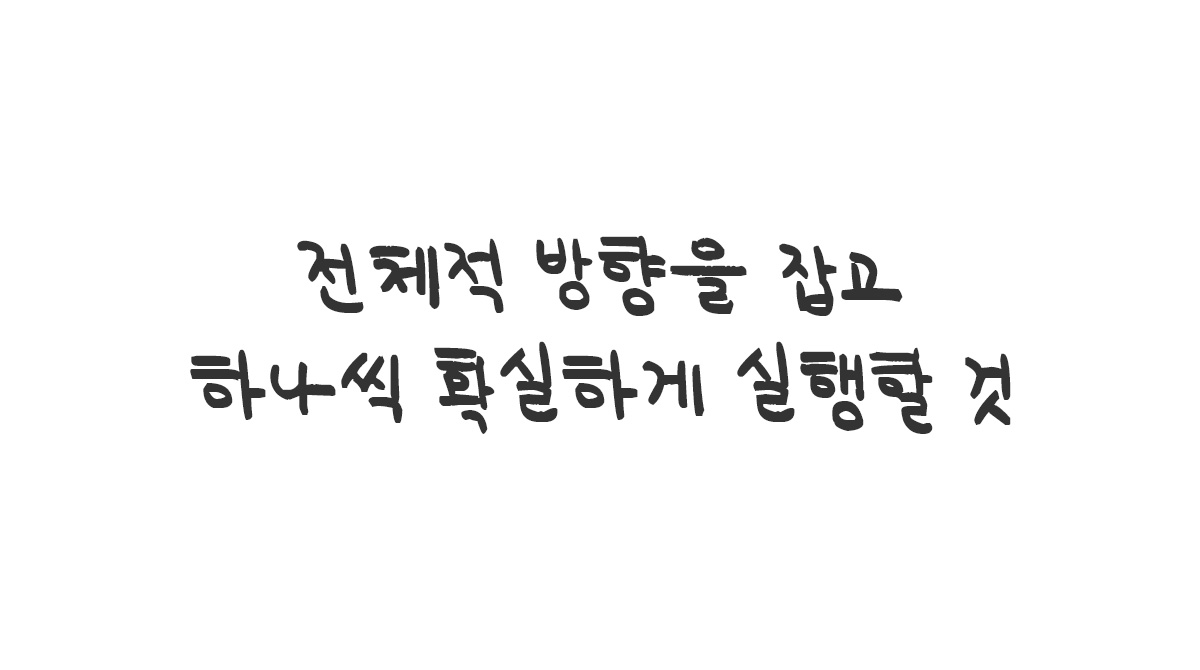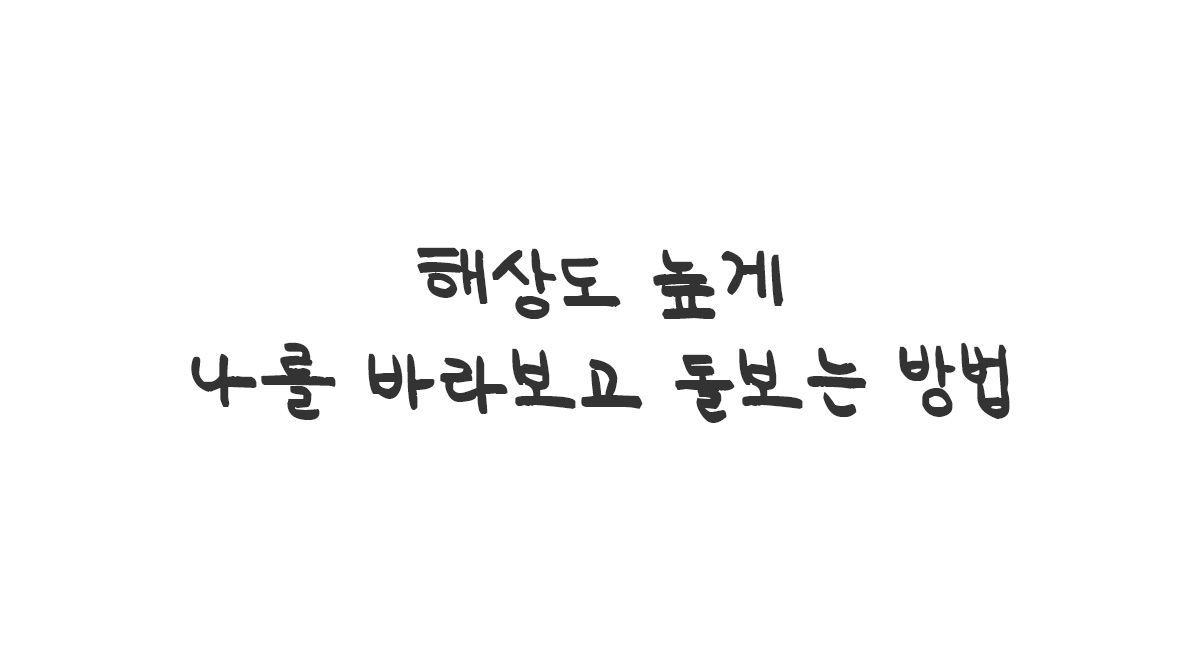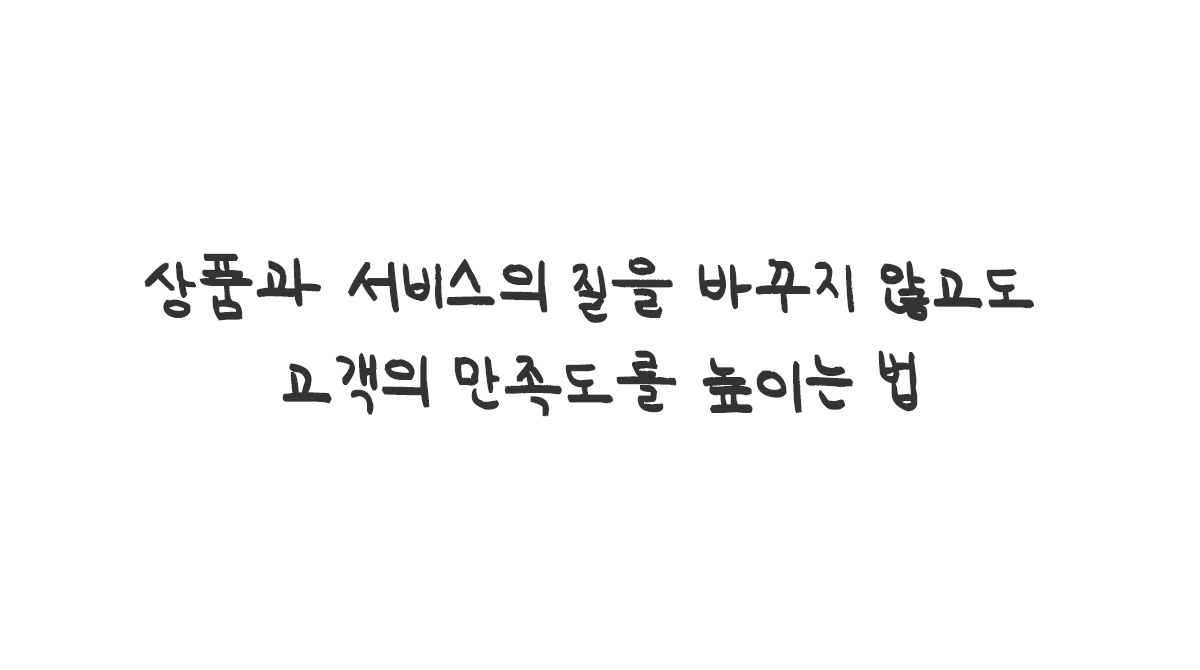요즘 EBS 유튜브를 보는 재미에 빠졌다. 위대한 수업, 미라클 주말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인 리하르트 프레히트 편의 일부를 기록해보려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지난 수백년간 철학자들은 행복은 찾는다고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말해왔다. 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연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평온함이 중요하다.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행복을 바라보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점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작은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행복의 공식이라 생각한다.
EBS 위대한 수업 리하르트 프레히트 편 중에서
이 말들에 동의했다. 행복은 목적지가 될 지점이나 영역,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오히려 찰나의 순간이나 어떠한 상태에 가깝다고 느낀다. ‘행복’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2가지 의미가 나온다. 어학적 의미로도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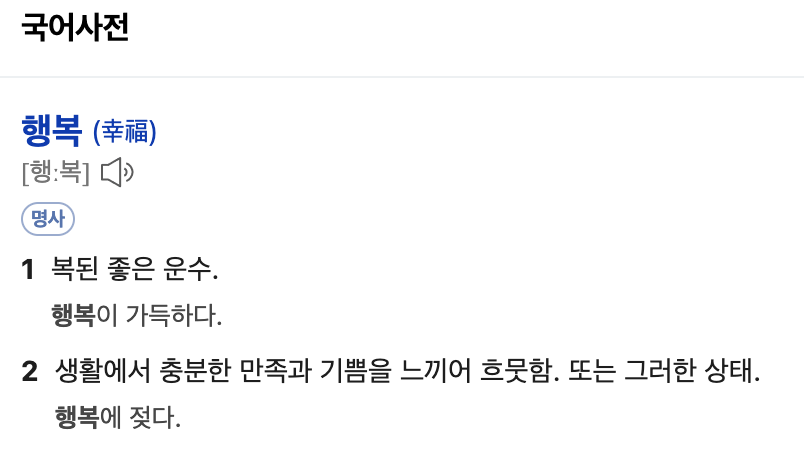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처한 상황이 맘에 들지 않아도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다.
햇빛이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부는 어느 날, 한입 먹기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맛있는 요리를 내어주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집 근처 강가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든다.
오랜만에 피크닉 매트와 책 한권을 들고 나가 뒹굴대며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을 만났을 때도 ‘행복하다’고 느낀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신호가 하나도 안 걸려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을 때, 회사에 도착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딱 열릴 때. 그럴 때도 분명 ‘행복’을 느낀다.
자기계발서의 흔한 문장 중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마주한 상황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하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내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영업으로 8년을 일하면서도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의심했고, 엄청난 능력자나 부장님들을 보면 난 저렇게는 못하겠단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울컥할 정도로 안심과 행복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은 매일의 업무에 치이다보면 또 사라진다. 잊혀질 때쯤 또 찾아온다. 이 순간에 있었기에 지난한 매일이라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었다.
철학의 쓸모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 임마누엘 칸트시대를 초월해 인류가 마주해온 질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철학이라 불렀다. 철학은 ‘좋은 삶은 무엇인가’를 묻는 오래된 기술이자 훈련과정이다. 이것이 철학의 기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걱정을 덜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등의 당장의 어떤 효용 말이다. 하지만 그건 철학에 대한 오해다. 그건 자기개발서의 역할이다.
철학이 다루는 커다란 질문을 생각해보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바라야 하는가자기개발서는 답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답을 찾고 나면 앞선 커다란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은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학에서는 커다란 질문에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왜 철학을 배워야 하나?
자신과 지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철학이다. 철학의 목표는 특정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전진할 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철학책을 보는 것은 타인의 두뇌를 탐구하는 것과 같다. 타인의 생각과 자신만의 관점을 연결하여 누구나 표현 가능한 객관적 관점이 아닌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철학자가 된다.
EBS 위대한 수업 리하르트 프레히트 편 중에서
2년 전쯤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칸트, 니체, 사르트르 등 특정 철학자의 어떤 이론보다 철학의 존재방식 자체가 매력적이며 삶 그 자체와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철학의 역사는 ‘제안 → 비판 → 재제안’이라는 흐름의 연속이다
한 철학자가 문제를 마주한다. 나름대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세상에 내놓는다.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이것이 한동안 정론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세상과 사람들이 변하면서 정론이라 여겨지던 이론에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철학자가 ‘그 답은 이런 면에서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며 다른 생각을 제안한다. 철학은 이런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정답이나 이상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은 늘 불완전한 학문이었고, 그러므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 생각의 주제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한번쯤 마주해볼 질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철학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